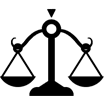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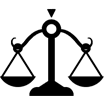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5-23 | 조회수 : 74 |
속리(俗離)는 세심정부터
속세를 벗어났다는 뜻의 속리산(俗離山). 그런데 속리산 어디쯤 가야 속세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 공원에서 관리하는 출입구를 지나면, 아니 더 오리숲을 지나 법주사라도 지나야 속세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적어도 세심정(洗心亭)은 지나야 한다.
2025. 2. 2.(일) 무척 맑고 포근한 날이다. 아직 날이 새지 않은 7시 조금 넘어 집을 나섰다. 세상이 두꺼운 안개에 휩싸였다. 차 전조등을 켜니 길게 뻗어 나간 불빛 속에서 안개 알갱이들이 요동을 쳤다. 법주사 아랫마을에 도착하니 날이 샜다(07:30).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전날 보은도서관에서 김용남이 지은 “옛 선비들의 속리산기행”이라는 책을 읽었다. 1600~1800년대 선비들이 속리산을 다녀가면서 쓴 기행문이다. 속리산 가까이 살면서 산에 크게 관심을 갖다 보니 이제 이런 책에도 눈이 간다. 수레(가마가 아닐까 싶다)를 타거나 피리 부는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오르거나 승려가 낮은 신분으로 여행을 안내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억불숭유(抑佛崇儒)의 양반이 지배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떠올려볼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상환암의 학소대, 은폭(隱瀑) 이야기에 눈이 많이 갔다. 이 책이 다음날 나를 상환암으로 이끌었다.
속리산 산행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공원 입구에서 세심정까지 약 3.5km의 평탄한 길을 걸어야 한다. 지금은 저수지와 계곡 옆으로 따로 ‘세조길’을 만들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만, 산행하는 사람에겐 그 길을 걷는 것이 고역이다. 본격적인 산행을 하기도 전에 지치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나도 오랜 기간 그쪽이 아닌 신정리, 운흥리, 화북, 도화리 쪽에 속리산을 올랐다. 어쨌든 상환암에 가려면 그 길을 걸어야 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재미가 준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걷는 자세도 바르게 하려고 하였다. 한참 그렇게 걷다 보니 마치 수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순간에는 작게 소리 내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해 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 걸음과 마음가짐, 염불이 속세를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과정의 끝에 ‘세심정(洗心亭)’이 있다. 마음을 씻으면서 닿은 곳이 세심정이다. 진짜 속세로부터의 벗어남은 그곳에서부터다. 세심정 부근에 세워진 표지판 내용이 새롭게 다가왔다(08:02).
"세속을 떠난 산에서 마음을 씻는 정자(터)란 뜻으로, 세속을 떠나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는 지금의 현실문제 즉 사업문제, 직장, 가정문제 등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은 저 산 밖에 내려놓고 이곳에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내 앞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을 즐기라는 뜻이다.
「이 산에서 주는 글 ; 눈앞에 보이는 일부터 미루지 말고 확실히 즐겁게 하면 “생활의 도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리 걱정하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세심정에서 만난 한 분은 관음암에 간다고 하였다. 그동안 속리산 암자는 다 가 보았다고 생각하였다가 최근 관음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날도 시간이 되면 가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심정에서 천왕봉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조그만 폭포바위가 있다. 윗부분이 꽤 넓게 둥글고 그 위로 물이 흘러와 사방으로 떨어지는 모양이 멋지다. 얼었을 때의 모습도 보기 좋았는데 작고 검은 새 한 마리가 눈이 쌓인 그 바위 윗부분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 머물렀다.
상환암과 신선대 갈림길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300여 미터 올라가면 조선 23대 왕 순조(1790~1834)의 태를 묻은 태실이 있다. 순조는 정조가 1800년 죽은 뒤 11살 나이로 즉위하였다. 이곳 태실은 처음 가는 것이고 아무도 가지 않아 눈 쌓인 길이 애매하였지만, 그런대로 잘 찾아 올라갔다. 작은 능선에 올라 태실이 오른쪽에 있는지, 아니면 왼쪽으로 더 올라가야 하는지 판단해야 했다. 왼쪽을 택했다.
계속 가파른 오르막이었다. 어느 순간 그 길이 태실로 가는 곳이 아님을 깨달았으나 갈 수 있는 데까지 가 보자는 생각에 앞으로 나아갔다. 능선은 큰 바위 지대인데 길이 끊겼다. 무리하면 올라갈 수도 있으나 눈이 쌓여 위험했다. 그 아래는 낭떠러지다. 이런 때는 무척 긴장된다. 도로 내려갈지 아니면 우횟길을 찾아갈지 고민하다가, 바위 지대 오른쪽으로 더 올라가 보기로 하였다. 어느 순간부터 고라니 발자국이 길을 안내했다. 산짐승도 다니는 길이 있다.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길을 오르다가 바위 위에 세워진 탑이 보였다. 그땐 그 탑이 세워진 곳이 태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생각이 바뀌었다. 바위 너머 저 깊은 아래, 양쪽으로 아주 큰 바위를 배경으로 상환암이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이다. 원래는 태실을 보고 도로 내려가 상환암으로 가려고 하였던 것인데, 전혀 다른 길로 와서 상환암을 보게 되었다. 탑은 상환암에서 관리하는 것 같았고, 가만히 보니 상환암 쪽으로 두껍게 쌓인 눈 위로 밧줄이 탱탱하게 이어져 있는 게 보였다.
양쪽으로 큰 바위와 푸른 소나무, 흰 눈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상환암이 너무나도 멋졌다. 낯설고 두려운 길을 가다가 이리도 멋진 풍경을 만나다니 큰 횡재라도 한 기분이었다. 태실로 가지는 못했지만, 두려운 산행 속에서 갑작스럽게 만난 멋진 풍경에 크게 흥분했고 그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상환암으로 바로 내려가지는 않고 능선을 따라 산을 더 올라가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로 내려왔다.
능선에서 상환암을 내려가는 길은 뚫고 가기가 쉽지 않았다. 경사가 심하고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곳이 많았다. 눈 위로 드리운 밧줄도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 절을 바라보며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야 했다. 험한 바위 지대이긴 하지만 때로 엉덩이 썰매를 타면서 상환암에 오르는 길에 닿을 수 있었다. 안전한 곳에 오니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상환암에서 등산화 속으로 들어간 눈을 털고, 따뜻한 홍차를 마시고 인절미를 먹었다. 산행에서는 이런 때가 제일 여유롭다(09:35).
속리산에는 8봉(峯), 8대(臺), 8석문(石門)이 있다. 8봉은 천왕봉, 비로봉, 길상봉, 문수봉, 관음봉, 묘봉, 수정봉, 보현봉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길상봉(吉相峯)의 위치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모른다. 이 길상봉을 찾기 위해 외사촌 형이 2019년 공단에 물어보았는데, “길상봉은 그 위치가 명확히 기록된 것이 없어 자체조사 및 지역주민 구술조사 결과 문수봉에서 법주사 쪽으로 내려오는 한 봉우리로 추정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한다. 내가 상환암의 거사님에게 길상봉을 물으니 그도 모른다고 했다.
상환암(上歡庵)의 옛 이름이 ‘길상암’이다. 세조가 복천암을 다녀갈 때 이곳에서 7일 동안 기도하고 선왕 태조의 유적을 추모하는 즐거움이 비할 데 없다고 하면서 이 암자를 상환암이라고 했다는 구전이 있다. 그렇다면 길상봉도 그 주변에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 주변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 태봉인데, 이것은 순조의 태실과 관련된 이름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태봉이 그전에는 길상암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본다.
상환암의 명물은 학소대와 은폭인데, 은폭은 소리만 듣고 나중에 가 보기로 하고 발을 뗐다. 지금까지 산행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즐거움과 기운을 얻었다. 상고암을 향해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키가 큰 한 분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올라갔는데, 그는 배낭의 부피가 컸고, 아이젠을 차지도 않았고 장갑도 끼지 않았다.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 곧았다. 산을 무척 좋아하는 베테랑으로 여겨졌다.
천왕봉으로 가는 길에서 상고암으로 갈라져 가는 길은 두어 사람만 지나간 흔적이 있고 눈이 깊었다. 스패츠를 차고 편하게 걸어갔다. 그 길은 30여 년 전 혼자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은 국문과 다니는 여대생을 만났던 곳이다. 난 그때 속리산 봉곡암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노스님 주려고 딴 산딸기를 허기진 그 여대생에게 다 주고, 같이 산에서 내려와 밥도 사 주었다. 그때 그녀가 준 시는 아직도 갖고 있다. 공부에 방해될까 봐 연락처는 받지 않았는데, 그 후 많이 후회했다.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면 아주 많은 편지가 오갔을 것이다.
상고암 마당은 사람 다니는 곳만 눈을 치우고 다른 곳은 무릎 절반까지 빠지는 눈이 그대로 있었다. 한두 사람이 손으로 치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탑, 칼, 비파 따위를 든 사천왕 등이 새겨져 있다. 사천왕이 그렇게 바위에 새겨진 것은 처음 보았다. 전에도 상고암에 몇 번 왔었는데 그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같다.
상고암을 지나서는 빠른 걸음으로 내려갔다. 관음암까지 갈 엄두를 낼 수 없었다. 벌써 1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세심정부터는 스틱을 가방에 묶어 달고 저수지까지 천천히 뛰어갔다. 배낭만 아니면 더 가뿐하게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뿌듯한 산행이라 그런지 그렇게 뛰어도 기운이 남는 느낌이었다. 이날 산행은 5시간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