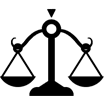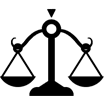2020. 11. 28.
아침을 해 먹고, 잠자는 아들을 깨워 시골집에서 5km 정도 떨어진 활목재까지 태워달라 했다. 활목재는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에서 상주시 화북면 용화로 넘어가는 고개다. 이날 산행은 활목재에서 금단산, 신선봉, 주봉으로 이어지는 능선 종주다. 평소 집에서 바라보이는 활목재에서 금단산까지는 가보고 싶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산행의 고수들이다.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아들에게 난 그들과 다르다고 했다. 녀석이 뭐가 다르냐고 바로 물어왔다. 말문이 살짝 막혔다. 난 산을 느끼지만 그들은 질주한다고 했다. 대답이 신통치 않았다. 나의 산행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떠오르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이 더 크게 산을 느낄 수도 있다. 그냥 개성이라고 얼버무렸다.
(09:04) 활목재부터 오르막이 오래 갔다. 멧돼지 소리가 들린다. 혼자 산행에 그 소리를 들으면 전에는 소름이 돋았는데, 이젠 조금 나아졌다. 그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일었던 무서움은 내려앉았다. 난 오히려 소리를 질러 그들에게 내 존재를 알렸다.
참나무 낙엽이 두껍게 쌓여 오르는 길이 미끄러웠다. 천천히 내 몸과 낙엽을 느끼며 걸으려 했다. 햇살이 뚜렷했다. 이끼가 낀 널찍한 바위 위로 비친 햇살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사기잔에 따뜻한 보이차와 보드카를 부어 마시며 그 이끼와 햇살, 바위, 바람, 파란 하늘을 만끽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끼 낀 바위 위에 오른 사기잔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한 분이 “현대문명과 원시 대자연의 조화”라고 하였다.
산을 오르는데, 자꾸 심재철 검찰국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심각한 갈등 속 한 가운데에 있다. 이 갈등은 우리 현대사의 흐름을 좌우할 만한 것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와의 짧았던 인연이 산행 속에서 그를 떠올리게 하였다.
그와는 1999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같이 일했다. 난 초임이었고, 그는 나보다 1년 선배였다. 나이는 나보다 두 살 아래인데, 내겐 몇 번 형이라고 불렀다. 그는 일도 잘하고 술도 잘 마셨다. 지방대 출신이라 아는 선배 검사 하나 없는 내게, 검찰 선배이면서도 형이라고까지 불러주는 그가 고마웠다.
난 그와 2002년인가 2003년에 한 번 다시 보았다. 그는 전북 완주 출신이다. 내가 전주지검에 근무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경운기를 몰다가 사고가 났다. 그의 상가에 갔는데, 그는 아버지를 장례식장이 아닌 시골집에서 모셨다. 그는 아버지를 장례식장의 차가운 영안실에 두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다.
그는 지금 무척 외로울지도 모른다. 대다수 검사들과 반대쪽에 서 있다. 그가 국장으로 있는 검찰국 검사들까지도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낸다고 언론은 말한다. 그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내기를 바란다. 내 짧은 인연으로 보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산은 참나무 천지다. 키가 무척 컸다. 그 무리 속에서 소나무 하나가 보였다. 주변의 참나무를 따라, 살아남기 위해, 같이 키를 키웠다. 그런 생존의 힘을 보면 덩달아 힘있게 살아야 할 용기를 얻는다. 이런 것이 어쩌면 산행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
금단산(746m)에 오르니(11:05) 사방이 확 트인다. 바로 앞으로 낙영산, 백악산이 보인다. 왼쪽으로는 신선봉이 보이고, 그 오른쪽으로 달천을 가로지르는 어암리 다리 옆, 청주로 산악회 회원들과 도시락 먹던 곳도 보인다. 바람이 찼지만, 햇살은 따스해, 맥주를 마시며 꽤 오래 머물렀다. 내가 조바심 내지 않으면 시간은 나를 잡아당기지 않는다.
신선봉으로 가는 길 왼쪽으로, 잎 진 참나무 가지들 사이로 멀리 우뚝 선 봉우리가 보였다. 뭔가 싶었더니, 바로 내 애인 애기업은바위였다. 그렇게 멀리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봉우리가 무척 반가웠다.
산 아래 대원리 저수지가 햇살에 반짝거렸다. 애초 계획했던 주봉까지는 못 가고 체메기고개에서 발을 멈췄다(13:00). 그 고개에서 따뜻한 햇살을 우산으로 삼고 앉아, 그동안 들고 다니며 마시다 남은 보드카를 다 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