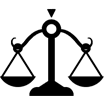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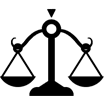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31 | 조회수 : 399 |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다. 차 계기판은 영하 12도다. 이런 날 산행은 긴장된다. 산에서도 견딜만한 추위인지, 길은 잘 찾아갈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지난 주 산행을 마친 구병리 입구에 차를 세웠다. 이번엔 아들 선재가 같이 했다. 마을 입구에 큰 키로 늘어선 수십 그루의 소나무들이 마을의 품격을 높여주었다. 소나무 사이에는 벤치들이 있었다.
마을은 급한 오르막 비탈에 펼쳐져 있었다. 산을 찾는 이가 많은 때문인지, 산장이라는 이름의 펜션도 있었다. 예쁘게 잘 정돈된, 정말로 알프스의 작은 산골마을 같은 느낌이었다.
거의 마을 끝까지 올라가, 왼쪽으로 난, 지난 번 내려온 2코스로 올라탔다. 선재는 집에서부터 그때까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다. 추운 날씨에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보통 산행을 하다보면, 속이 불편한 것은 없어진다. 운동에 따른 호흡이 몸을 잘 순환시켜 주기 때문일 것이다.
산엔 눈이 쌓여 있었다. 잘 미끄러지지는 않아 아이젠을 찰 정도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맨땅보다 훨씬 더 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길은 계속 오르다가 능선 가까이 가서야 조금 평평해졌다. 아직도 배가 아픈 선재의 안색은 별로다. 목도리에 털모자, 두툼한 벙어리장갑까지 껴 추위는 견딜 만 했다.
어느 순간, 뒤에서 선재가 크게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괜찮냐고 물으니 답이 없다. 다쳤나? 녀석은 일어나서 한참 있다 괜찮다 했다. 녀석에게 아이젠을 차게 했다. 아이젠은 하나밖에 없어, 난 나의 균형감각을 믿고 갈 뿐이었다.
능선까지 닿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오른쪽으로는 구병산, 우리는 왼쪽으로 간다. 조금 걷다 보니, 전망이 트인 곳이 나왔다. 속리산이 한 눈에 다 들어왔다. 왼쪽부터 애기업은바위, 묘봉, 관음봉, 문장대, 비로봉, 천왕봉, 형제봉 들이 서로 이어져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 앞으로 주능선에서 뻗어 나온 산들이, 또 수많은 변화를 보이며 그림의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 멋진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산행의 참맛이다.
853m 봉우리를 지날 때는 밧줄을 타고 오르내리는 구간이 두어 곳 나왔는데, 눈이 쌓여 있어 아찔아찔했다. 아이젠을 차지 않으니, 공포감이 더한 것 같았다. 곳곳에 ‘급한 벼랑이라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표지판도 겁을 주었다. 미리 아이젠을 제대로 준비 못한 잘못을 또, 뒤늦게 후회하였다.
가끔 사람들도 만났다. 다 오른쪽 적암리에서 올랐는데, 공교롭게 다 부부였다. 산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나도 아내 컨디션이 좋아지면, 같이 다녀야지.
눈이 쌓였지만 앞서 간 사람들 발자국으로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산 아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다 싶었다. 신선대에서는 한 부부가 조망이 너무 좋다며 한참을 머물며 사진을 찍었다. 그곳에서도 속리산이 한 눈에 다 들어오긴 마찬가지였다. 형제봉이 더 가까워졌다.
신선대를 지나 조금 더 가면, 오른쪽으로 절터, 적암리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온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눈 위로 사람 발자국이 끊어졌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이제는 우리가 길을 찾아 가야 하는 것이다. 눈이 쌓이지 않았다면, 맨땅이라도 사람들 발자국 흔적이 있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눈이 그 흔적을 덮으니 스스로의 판단으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표지기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표지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 상황은 바로 왔다. 능선 왼쪽으로 희미하게 길이 있는 것 같고, 그 앞으로 오래된 표지기도 하나 있어, 그 길이 봉우리를 돌아가는 우회길로 생각되었다. 5분 정도 가니, 우회길은 아니고, 계속 가면 마을로 갈 것 같았다. 잠시 머뭇거리면서 산행을 포기하고 그냥 내려갈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선재가 “길이 아니야?”라고 묻는다. 그렇게 묻는 아들 앞에서, 그냥 내려가자는 말을 내뱉기는 어려웠다. 다시 능선으로 올라, 능선을 따라 가니, 그것이 맞는 길이었다. 중간 중간 표지기도 잘 보였다. 크게 마음을 놓고, 잠시 앉아 귤을 까먹기도 했다.
한참 동안 길은 비교적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 원래는 동관음고개까지 가려고 했는데, 날도 춥고 선재가 힘들 수도 있으니, 그 전인 장고개에서 느긋하게 마치자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런 느긋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길을 잃은 것이다.
우리가 가던 구병산의 줄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가 상주시 화남과 보은 구병리를 잇는 지방도를 만난다. 장고개도 이 지방도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할 충북알프스 길은 주능선 끝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주능선에서 도중에 이렇게 갈라지는 길을 찾기란 쉽지 않다. 쌓인 눈이 그 길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주능선 길을 따라 갈 것이다. 우리가 그랬다.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다닌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길을 잃은 것이 틀림없었다. 물론, 아래쪽으로 아까 말한 지방도가 얼핏 보여 조난을 당할 걱정은 없었지만, 길 아닌 곳을 통해 내려가는 것이 꽤 어려웠다.
우선 큰 바위 지대를 뚫고 가야 했다. 산에서 길을 잃어도 바위가 없는 곳을 따라 내려갈 수 있다면 다행인데, 바위산에서는 바위 지대를 뚫고 가야만 할 때가 있다. 다시 길을 찾아 돌아갈 수는 없었다.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바위 지대를 통과했다. 선재가 무리가 되었던지, 갈비뼈가 아프다고 했다. 그 이후에도 돌들로 이루어진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여러 번을 넘어졌다. 뒤에 오던 선재가, “아빠 다음에 혼자 올 때는 이런 데 오지 마”라고 한다. 아빠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다.
지방도에 내려서서 다시 장고개까지 1.5km를 걸어 올라야 했다. 느긋한 장고개가 아니라 고난의 장고개가 되었다. 나중에 산행 베테랑 해균이에게 길 잃은 이야기를 하니, 길을 잃을 곳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눈 쌓인 산길은 다르다. 더군다나 주능선에서 도중에 빠져야 하는 길이니.
장고개에서는 미리 부른 택시를 타고 구병리까지 갔다(4만원). 구병리 명물이라는 송로주(알콜도수 40도) 1병을 사 집으로 돌아왔다(37,000원). 뜨뜻한 아랫목에 한참을 누워 몸을 녹였다. 속리산의 큰 아름다움을 보고, 길을 잃었어도 아들과 함께 그것을 헤쳐나간 보람 있는 산행이었다. 선재는 당분간 산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다음 충북알프스 3차(장고개~피앗재)는 나 혼자다. 어떤 이들은 밤을 새며 충북알프스를 한꺼번에 다 종주하기도 한다. 난 이렇게 조금씩, 산을 음미하며 가는 게 좋다. 그래야 산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느니 말이다.
일시 : 2020. 12. 18. (토) 맑음
코스 : 구병리 ~ 능선 ~ 853봉 ~ 신선대 ~ 장고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