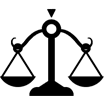아침 일찍 출근해, 소리를 내 시 읽기를 몇 년째 꾸준히 하고 있다. 시인의 정서가 응축된, 절제된 문구에 감화를 받는 것도 큰 기쁨인데, 홀로 있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소리의 운율을 느끼는 것 또한 양보하지 못할 즐거움이다.
요즘은 형석중학교 교감인 섬동 선생의 시집 ‘스승을 말하다’를 읽고 있다. 출판사는 그를 “자연과 밥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교육의 진정성을 찾아가며 생활 명상과 인성 문화에 대한 글을 쓴다”고 소개한다. 그는 학생들과 손 모음 맞절을 하고 함부로 말을 놓지 않는다. 그에게는 세상 모든 게 스승이다. 특히, 학생이 그렇다. 그에게 학생은 ‘내 뒤에 온 스승’이다.
얼마 전, 섬동 선생이 내게 ‘문정(文靜)’이란 아호(雅號)를 지어주었다. 내 고향 ‘문의(文義)’와 ‘정암(靜庵) 조광조’를 떠올려 지어주신 것이다. 그가 좌우명을 묻기에, ‘내가 옳다는 생각 내려놓기’라 하였더니, 서예가 지원 박양준 선생이 쓴 글씨를 갖다 주셨다. 스스로 더 잘 살피며 살라는 배려일 것이다.
2009년, 10여년 해 온 검사를 그만두고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문경 정토수련원으로 100일간 출가해 행자 생활을 했다. 밥하고, 똥 치우고, 행자들과 마음 나누기를 하면서, 스스로 내려놓는 공부를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새벽 예불 때마다, 대중이 함께 ‘참회문’을 읽었다.
“화나고, 짜증 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것은, 밖으로 살피면 상대가 잘못해서 생긴 괴로움인 것 같지만, 안으로 살피면 ‘내가 옳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일어난 것이므로, 모든 법에는 본래 옳고 그름이 없음을 깨달아, ‘내가 옳다’는 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온갖 업장은 녹아나는 것이다.”
내가 옳고 잘났다는 생각에,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게 못마땅하고 괴롭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옳고, 잘난 사람인가? 주변에 내 기준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옳고 잘났다는 기준을 내려놓는 게 ‘참회’다. 참회하면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주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서로 소통하는 참다운 관계가 만들어진다.
검사와 판사의 자리는 무겁고 힘든 자리다. 나의 판단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아주 오랜 기간 교도소에 가둘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법의 이름으로 빼앗을 수 있다. 늘 고뇌와 책임감, 성찰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 검사, 판사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일반 시민은 갖지 못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한다. 언제나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검사, 판사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어 나라를 주무르고 있다. 대통령은 외교 현장에서 국회의원에게 “새끼들”이라고 막말하고도 사과할 줄 모른다. 정부의 무능으로 이태원 ‘참사’가 터져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음에도, 정치판으로 가 권력을 잡은 검사, 판사들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언제나 옳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좁디좁은 사고 체계 안에서.
그들의 독선에 시민은 피멍이 든다. 머슴에게 일을 시켰는데, 주인에게 달려들어 주인을 패는 형국이다. 참고만 있으면, 주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