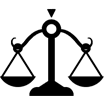변호사

[ 충청매일 ] 1986년 법학과에 입학해 처음 배운 법 과목이 헌법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권력 구조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밝히고 있다.
아주 오래도록 한반도에 적용된 정치체제는 왕정이었다. 왕이 주권자이고, 백성은 왕의 명령에 따르는 지배의 객체일 뿐 일부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왕이 주는 시혜에 지나지 않았다. 194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헌법은 수천 년 이어온 왕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온 세계에 천명하였다.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존재 이유가 개인의 인권 보장에 있음을 뚜렷하게 밝혔다.
그러나 아주 유감스럽게, 제헌헌법을 만들 때는 물론 내가 법학과에 들어갈 때, 사회 현실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었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해 존재했고, 헌법 가치는 법조문과 교과서에만 있었다. 가치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법학도들은 사회를 원래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헌법을 시험용으로만 공부하였다. 그렇게 공부한 이들이 권력을 잡고는, 헌법 가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것이 법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온갖 법 기술을 부리는데, 그것이 제헌헌법을 만든 지 78년이 지난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며 합리화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파면’으로 철퇴를 가했다. 그런데도 그는 파면 후 사저로 돌아올 때 개선장군 행세를 했다. 그런 그를 보면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곡해하여 구속을 취소한 판사,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총장이 떠올랐다. 헌법 가치를 시험용으로만 공부한 이들의 정신세계에 참다운 헌법 가치가 들어갈 공간은 없었다. 시험용으로만 헌법을 공부하였다고 자백한 이가 또 있다. 한덕수 대행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2024헌나9).
이처럼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 가진 한덕수는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서 고위직 인사를 하는 등으로 상황을 적극적으로 창조해서는 안 된다. 그도 이런 한계를 주장하면서 국회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 태도를 확 바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였다. 그에겐 논리 일관성도,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도 전혀 없다. 그의 머리엔 헌법이 없다. 이것이 헌법을 시험용으로만 공부한 이들의 무식함이고 몰염치다. 다행히 현재는 지난 16일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헌법이 그나마 간신히 살아남았다.